왕조실록에서 엿보는 조선인의 민족성 100여년이 지난 현재의 조선(한국)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와 서로 물고 뜯는 流弊(유폐)는 변함이 없다.  證人(회원) 證人(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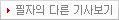
年前에 일본으로 떠났던 통신사 일행이 다녀와 '필시 병화(兵禍)가 있을 것입니다.'라는 보고서를 올렸다. 임금(선조)이 이들을 불러 확인했다. 上使 황윤길이 보고서대로 아뢰자 副史 김성길이 나서 '그러한 정상은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윤길이 장황하게 아뢰어 인심이 동요되게 하니 사의(事宜)에 매우 어긋납니다.'라며 어기댔다.
임금이 말머리를 돌려 '(풍신)수길이 어떻게 생겼던가?' 하고 물었다.
(황) '눈빛이 반짝반짝하여 담과 지략이 있는 사람인 듯하였습니다.'
(김) '그의 눈은 쥐와 같으니 족히 두려워할 위인이 못됩니다.'
通信使 上使와 副史로 같이 일본에 가서 보고 듣고 온 황윤길과 김성일의 보고가 이렇게 180도 달랐다. 그 이유를 실록에서는 "성일이 일본에 갔을 때 윤길 등이 겁에 질려 체모를 잃은 것에 분개하여 말마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했으며, 김성일은 당시 집권 세력인 東人에 속해 있었으므로 西人이었던 황윤길의 보고는 '西人들이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인심을 요란시키는 것'으로 배척되었다는 부연설명이 기록되었다.
이런 기록도 있다. 유성룡이 김성일에게 "그대가 '황'의 말과 고의로 다르게 말하는데, 만일 병화가 있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오?" 하고 묻자 김성일이 "나도 어찌 왜적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겠습니까. 다만 온 나라가 놀라고 의혹될까 두려워 그것을 풀어주려 그런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전후사정이야 어찌되었든 김성일의 보고가 허위보고라는 것을 조선 조정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실록에는 거짓 보고를 한 김성일의 행적에 대해 좋게 썼다. "김성일은 그들(왜인)의 거만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논하고 1개월을 지체한 뒤에야 출발하였다."라던가 "성일이 그(대마도主)의 무례함에 노하여 즉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니…", "성일이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자 다음날 의지(대마도主)가…시중을 든 왜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와서 사죄하였다. 이런 일이 있은 이후로 왜인들이 성일을 경탄하여 보이기만 하면 말에서 내려 더욱 더 깍듯이 예를 지켜 대접하였다."라고 기록하는 한편, 황윤길에 대해서는 "윤길은 본래 비루한 사람으로서 글 잘하는 것으로 사신의 선발에 뽑혔지만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실록에다 써 놨다. 제대로 보고한 자는 비루하다고 한 반면 허위보고를 한 자를 극구 칭송한 것이다.
그런데 눈을 끄는 중요한 대목이 나온다. "왜인(倭人)들은 황(윤길)과 허(書狀官 許筬)를 비루하게 여기고 성일의 처신에 감복하여 갈수록 더욱 칭송하였다. 그러나 평의지(平義智/대마도主)만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여겨 매우 엄격하게 대우하였기 때문에 성일이 그곳의 사정을 잘 듣지 못하였다."는 기록이다. 이를 미루어 짐작컨대 김성일은 정보차단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비록 기개가 있고 올곧은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외교관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시 통신使는 일본의 실상과 동태를 제대로 살피고 와서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이 근본책무였다. 그 보고는 외교나 국방의 전략을 짜는데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일은 허세만 부리다가 와서는 거짓보고까지 한 것이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참수감일 것이다.
황윤길과 김성일, 어쩌면 이들 둘의 성품 차이가 상호 보완이 되었더라면 절묘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당파에 몰입되어 서로 상극의 길로만 치닫다가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결국 조선은 아무런 대비도 없이 이듬해인 임진년에 왜란을 맞게 된다. 파당을 지어 나라보다는 자신들의 눈앞 이해에만 매달리다가 참화를 당했던 기록을 보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가 있으랴. 이에 더해 일본의 실체를 애써 얕보고 "에헴!"거리며 허세에 목숨을 건 어리석음에는 기가 찰 일이다. 그것이 김성일만의 모습이 아니라 조선 조정의 모습이었다.
이로부터 300여년 후 조선을 병합한 일본의 '통감부 자작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포고문'에서 <조선 고래(古來)의 유폐(流弊/나쁜 풍속)는 좋아함과 싫어함이 서로 어긋나고 이익만을 위해 서로 싸우는데 있으니, 이 때문에 한 당이 득세하면 다른 정파를 홀연히 해치고, 한 정파가 세력을 거두면 다른 당을 번번이 넘어뜨리고자 하여 서로 필적하고 배척하는 것이 그 끝을 알 수 없다가 마침내 파산하고…>라는 대목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이로부터 다시 100여년이 지난 현재의 조선(한국)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와 서로 물고 뜯는 流弊는 변함이 없다. 이는 가히 민족성이라 할 만하다.
덧붙임)
작금에 여야가 보여주는 정치적폐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나라의 運은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를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는 예감이 든다. 따라서 연착륙이 어려울 것 같고, 재수없는 소리 같지만 1997년 외환위기는 그 서막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