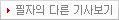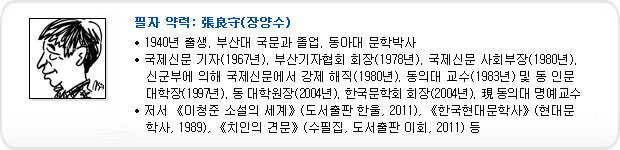때로는 한 장의 사진이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천 마디, 만 마디의 말 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 주는 수가 있다. 나는 독립운동가 姜宇奎(강우규) 선생의 얼굴사진을 볼 때 마다 그것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 흑백사진은 선생의 어깨 위, 얼굴을 찍은 것인데 그 오른 쪽에 縱(종)으로 ‘一三七三’이라는 숫자가 쓰여 있다. 이는 아마 日帝(일제)의 行刑機關(행형기관)이 死刑囚(사형수)였던 선생에게 붙인 囚人番號(수인번호)가 아닌가 싶다.
 |
姜 義士(의사)의 행적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아는 것이겠지만 여기에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요약한다. 선생은 1855년 平安南道(평안남도)에서 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나라가 망해 버리자 선생은 北間島(북간도)로 망명해 朴殷植(박은식)․李東輝(이동휘) 선생 등과 독립운동을 했다. 그러나 남의 땅에서 벌이는 그러한 운동은, 그것으로 나라의 주권을 되찾기에는 너무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 선생은 敵國(적국)의 要人(요인)을 죽이기로 결심했다.
1919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서울로 들어온 선생은 9월 2일, 부임해 오는 일본의 신임 조선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향해 폭탄을 던졌다. 폭탄은 표적을 정확하게 맞히지 못 해 사이토를 죽이지 못 했으나 일본인 將星(장성), 경찰서장 등 30여 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 擧事(거사) 후 선생은 그곳을 무사히 벗어났으나 얼마 뒤 조선인 고등계 형사 김태석의 손에 붙들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선생은 1920년 11월 29일 65세를 일기로 형장의 이슬로 殉國(순국)하였다.
선생의 氣槪(기개)는 대단했던 것 같다. 당시 그 분을 ‘取調(취조)’한 京畿道(경기도) 경찰부장, 일본인 지바 료는 그분을 ‘우국지사’였다고 하면서, 그분은 감정이 격해지면 벌떡 일어서서 책상을 두드리며 조선 독립의 당위성을 역설했다고 했다. 그 사건을 담당한 일본인 판사도 처음에는 義士를 ‘피고’라고 부르다가 재판이 진행되어 가면서 나중에는 ‘강 선생’, ‘영감님’이라고 고쳐 불렀다 한다.
姜 義士는 사형선고를 받은 후 ‘나의 죽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조그마한 깨달음이라도 주었으면 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한다. 선생의 그와 같은 소원은 그 분의 死後(사후)에 이루어졌다. 선생이 殉國(순국)한 후 ‘義烈團(의열단)’ 등 조국 독립을 위한 젊은이들의 비밀결사조직이 전국에서 잇달아 결성된 것이 그것을 말해 준다.
선생은 형을 받기 직전,
斷頭臺上 猶在春風 (단두대상 유재춘풍)
有身無國 豈無感想 (유신무국 개무감상)
이라 한, 詩(시) 한 수를 남겼는데 이를 意譯(의역)하면,
(죽음 앞에 섰으나 마음은 봄날 같이 평안하여라.
다만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그것이 슬프구나.)
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뜻이 크고 悲壯(비장)한 노래가 아닌가.
이제 다시 義士의 사진을 보자. 우선 눈을 보라. 이른바 ‘炯炯(형형)한 눈빛’이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이 아니겠는가? 義士의 얼굴에서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공포나, 자신이 결행한 바에 대한 후회 같은 것은 추호도 보이지 않는다. 거기서는 오직 ‘나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확고한 신념이 넘쳐날 뿐이다.
나는 이 사진을 볼 때 마다 내 살아온 70년 넘는 생이 참으로 초라하고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그때 마다 望洋之嘆(망양지탄)이라 할 탄식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