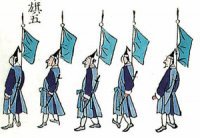|
조선군사들, 하루 30리 이내만 걷고 A텐트서 숙영했다
⊙ 무예 이야기 / 조선시대 행군훈련

고려시대부터 조선 선조 때까지 함경도에서 활약한 장군들의 행적을 엮은 ‘북관유적도첩(北關遺蹟圖帖)’ 중 ‘야전부시도(夜戰賦詩圖)’. 이 그림에는 현대의 A텐트와 비슷한 천막이 등장한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동아일보DB
《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행군’이란 강도 높은 군사훈련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요즘같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에도 국군 장병들은 ‘혹한기 훈련’이란 이름으로 산과 들에서 며칠을 보낸다. 이때의 행군훈련은 아무리 추위에 강한 사람이라도 이를 악물어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혹독하다.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오늘날과 비슷한 행군훈련이 있었다. 》
행군 30리 넘기면 전투마 지쳐
병농일치(兵農一致)를 채택한 조선의 군사 중 상당수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었다. 따라서 보리나 벼를 심고 수확하는 농번기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기가 어려웠다. 조선시대의 군사훈련은 겨울을 비롯한 농한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물론 행군도 훈련에 포함됐다. 조선의 병사들은 보통 인시(寅時·오전 3시)에 아침밥을 챙겨 먹고 묘시(卯時·오전 5시)에 군장을 메고 행군에 나섰다고 한다. 하루에 30리(약 12km)를 걷는 게 기본이었다. 모든 일정은 미시(未時·오후 1시)에 마무리했다.
행군 거리를 ‘하루 30리’로 제한한 이유는 병법서에 나온다. ‘이 거리가 넘을 경우 군사들의 근력이 쇠약해지고 전투마가 지쳐 적의 기습이 있을 때 아군 10명이 적군 1명을 당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오후 1시 즈음에 행군을 마치면 해가 지기 전 숙영지와 진지를 구축해 혹시 모를 적의 기습에 대비할 수 있었다.
특별한 경우에는 야간행군을 하기도 했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밀행(密行)’이라 불렀다. 밀행을 할 때는 군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전투마의 목에 건 방울도 떼고 걸었다. 모든 불빛을 감추고 북소리도 울리지 않아 적으로부터 아군의 동정을 감췄다. 불빛이 필요할 때는 조족등(照足燈·도적을 잡을 때 쓴다고 해서 조적등·照賊燈으로도 불림)이란 특수한 등을 이용해 발밑만을 비췄다.
이렇게 숨을 죽이고 밀행을 하다 보니 대열 앞쪽에서 발생한 일이나 명령을 뒤따르는 후미에 전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야간행군 중에는 특정한 물건을 후미에 전달해 명령을 주고받는 ‘암령(暗令)’ 훈련도 병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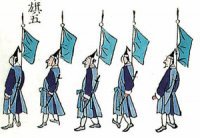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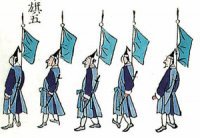
행군을 하던 군사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할 때는 나뭇가지를 비롯한 초목의 가지를 꺾어 조용히 뒤로 전달했다. 앉으라는 신호를 나타내는 물건은 돌덩이였다. 느리게 행군하라고 지시할 때는 긴 곤봉을 전달했고, 행군의 속도를 높이라고 할 때는 죄인의 귀를 뚫을 때 쓰는 관이(貫耳)라는 작은 화살을 전달했다.
그렇지만 암령은 전달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것이 각 방위를 상징하는 색깔의 작은 등불을 오방색(다섯 방위를 나타내는 색) 깃발에 달아 쓰는 방법이었다. 예를 들어 행군로의 앞을 수목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청색 등을 매단 청기를 들어 적의 매복에 대비하거나 우회로를 찾으라는 신호로 썼다. 물이나 늪지대가 나타나면 흑색 깃발을 올려 수중전에 대비하게 했다. 앞쪽에 군사나 전투마가 나타나면 흰색 등과 깃발을 올렸고, 연기나 불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붉은 등과 깃발을 들어올려 주변 상황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숙영지 주변엔 ‘지뢰’ 깔아
행군 도중 목이 마른 병사는 양가죽으로 만든 물통(양피낭)으로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휴대한 물이 떨어질 즈음엔 식용수 담당관이 특정 위치의 물을 지정해 병사들이 직접 떠먹게 했다. 이때는 혹시나 적이 물에 독을 풀었을 것을 우려해 진중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어린 가축이 먼저 먹어보게 했다. 물에 탈이 없는 것이 확인된 후에야 일반 병사들이 마실 수 있었다.
이렇게 행군을 하다 숙영할 곳에 도착하면 요즘 군대에서도 많이 쓰는 A텐트와 비슷한 간이 천막을 치고 군사를 쉬게 했다. 이런 방식의 간이 천막은 설치와 이동이 자유로워 전통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됐다.
숙영지 주변에는 귀전(鬼箭)이라고 해서 대나무 통에 날카로운 마름쇠를 넣고 똥물과 독약을 섞어 만든 일종의 ‘지뢰’를 주변에 깔아 적의 침입에 대비했다. 만약 적이 귀전을 밟으면 그 소리를 통해 수비군이 기습 사실을 알 수 있다. 귀전을 밟은 적군은 파상풍에 걸리게 된다. 또한 숙영지 주변으로 30보(약 36m) 밖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에 잘 타는 마른 나무들을 쌓아놓아 적이 불시에 공격하면 여기에 불을 질러 적의 형세를 살필 수 있었다.
조선시대에도 겨울철 행군은 고되고 힘든 훈련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전술훈련처럼 고도로 과학적이면서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극을 비롯한 대중매체에서 이런 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그저 화려한 전투 일변도로만 극을 구성해 매우 안타깝다. 숙영지에 갑자기 나타난 적에게 순식간에 초토화되는 조선군의 모습은 이제 사라져야 하지 않을까.
조선왕조가 500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치밀하고 체계적인 군사 운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조선군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선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최형국 한국전통무예연구소장·역사학 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