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일 놈’ 한 마디에 날아가 버린 생목숨
男兒一言(남아일언) 重千金(중천금)이라 했는데…
張良守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요즘 사람들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울화가 차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쌍욕, 막말이 난무하고 천하고 輕妄(경망)한 말이 횡행한다.
우리의 先人(선인)들은 옛날부터 言行(언행)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다. 그 대표적 사례로 朝鮮朝(조선조) 成宗(성종) 임금의 생모 昭惠王后(소혜왕후, 1437~1504) 韓氏(한씨)가 쓴 책, 《內訓(내훈)》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여성이 지켜야 할 네 가지 行實(행실)을 ‘四行(4행)’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婦言(부언)’이다. 이 책은 婦言에서 ‘말은 잘 선택해서 하고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은 하지 않으며 상대가 말을 할 때는 잘 듣고 할 말이 있으면 말이 끝난 후 조금 있다가 하라’고 이르고 있다.
여자가 시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곱 가지 죄, ‘七去之惡(칠거지악)’ 중 하나가 ‘口舌(구설)’ 곧 말을 함부로 해 말썽을 일으킨 경우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성에 대한 ‘입 단속’이 얼마나 엄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內訓》의 경우는 궁중이나 사대부가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반 민가의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런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야기 속에 그런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있다. 여자의 ‘입방정’을 경계하는 무서운 교훈담 <에밀레종> 전설이 그런 것이다.
新羅(신라) 惠恭王(혜공왕) 때 나라에서 봉덕사 12만 근 鐘(종)을 만들려 했는데 鑄造(주조) 중, 종이 터져 몇 번이나 실패를 했다. 원인을 알아보니, 한 중이 종 만들 쇠 시주를 받으러 다닐 때 한 여인이 업고 있는 어린 딸 ‘원산’이를 어르면서 ‘줄 것이라고는 이 애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말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한다. 그 어머니가 입을 함부로 놀린 바람에 죄 없는 어린 딸이 애처롭게도 끓는 쇠 가마에 던져졌다는 것이다.
의외로 그런 ‘말조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성에 관해서만 몰려 있고 남성과 관련된 것은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했던 것 같다. 당시 남자들은 《童蒙先習(동몽선습)》《小學(소학)》을 떼고 《四書三經(사서삼경)》을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체득하게 되어 있어, 사내라면 말을 조심해야 하느니 어쩌느니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입을 함부로 놀리는 者(자)는 사내 이전에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한 세상이었으니 그것을 가르치고 어쩌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요즘 이 나라는 어찌된 셈인지 여자보다 사내들 입이 더 문제인 것 같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국회의원은 국민 중에서 지도적 인물로 선출된 인재 곧 善良(선량)인데 그들이 하는 말의 품위가 영 말이 아니다. 민주당의 洪(홍) 모 의원은 朴正熙(박정희) 前 대통령을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의미의 ‘鬼胎(귀태)’라고 해, 뜻있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 지난 해 민주당 李(이) 모 의원은 당시 환갑 나이이던 朴槿惠(박근혜) 의원을 ‘년’이라고 했다가 호된 욕을 먹기도 했다.
정치인뿐 아니다. 의사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의사들 모임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여성들도 있는 한 회식자리에서 乾杯辭(건배사)를 ‘오바마’라고 하자고 하고는 그 말을 “오빠, 바라만 보지 말고…” 어쩌고 하고 해설까지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교수라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소위 한 명문대의 黃(황) 모 교수는 朴 대통령을 가리켜 ‘생식기만 여자일 뿐’ 어쩌고 하는 말을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일이 시끄럽게 되자 그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다고 펄쩍 뛰었지만, 그것은 변명이 안 된다. 말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어휘의 선택, 語法(어법·diction)이 的確(적확)해야 한다. 당시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곧 言衆(언중)이 그 말을 쌍스럽고 천하게 들어 문제가 되었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전공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상식도 없다니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딱한 생각이 든다.
글이나 말은 그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공사판에서 막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고되다 보니 작업 중에 술을 마시는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 말이 거칠 수 있다. 소설같은 글에서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사실적으로 그리려다 보니 俗語(속어), 卑語(비어)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떤 소설의 경우, 누나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을 들은 한 청년이 “누나가 그 새끼하고 지랄을 했다면 우리집도 인자 니기미…”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도 독자가 거기서 조금의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지도층에 있다는 公人(공인)의 말은 달라서 절대로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다시 옛날 이야기인데- 朝鮮 시대 양반가에는 사람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해 주는 전설 한 토막이 전해져 오고 있었다. 한 士大夫(사대부)가 어떤 대감 댁에 손님으로 가, 주인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밖이 떠들썩해졌다. 주인이 그 집 老僕(노복)을 불러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종 아무개가 술이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주인이 “거, 죽일 놈이다”고 하자 老僕은 ‘예’하고 물러갔는데, 그러고 한 식경쯤이 지나자 그 늙은 종이 다시 와 “나으리, 종 아무개 죽였습니다”고 하고 대감은 “알았네”하더라는 것이다.
종도 인간이니 술을 마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주정을 할 수도 있는데, 자세한 경위도 알아보지 않은 채 찻상머리 閑談(한담)처럼 한, 한 마디로 귀중한 人命(인명)을 앗은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 시대 사람들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던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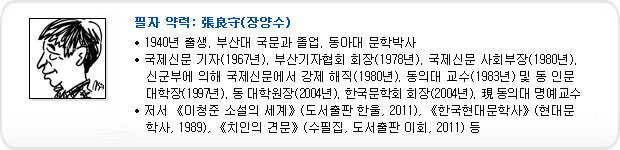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