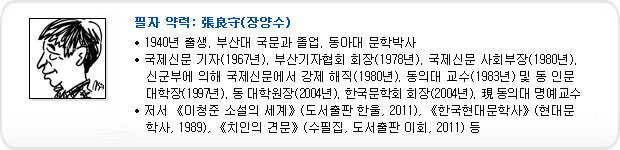民譚으로 정겨운 시간보낸 우리 先人(선인)들
民譚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재미(amusement)’ 뿐이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극장도 없던 지난날 우리의 先人들은 사랑에 둘러앉아 이 民譚 이야기를 하며 긴긴 밤을 심심치 않게 보낼 수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주로 나이 든 사람이고 듣는 사람들 중에는 나이 든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들 사이에선 재미있는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야기를 듣는 쪽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도 해달라고 조른다. 하는 쪽은 전에 한 것을 또 하는 것이니 싫증이 나 하지 않으려 한다. 그래도, 박절하게 ‘싫다’, ‘귀찮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야기 좋아하면 걸뱅이(거지) 된다’고 면박을 주기도 한다. 상대는 그것이 겁이 난다고 순순히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꾼을 위협하기도 한다. 이것이 이야기를 알고만 있고, 하질 않으면 이야기가 앙갚음을 한다는 民譚이다. 전라북도 錦山郡(금산군)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口傳(구전)되고 있다.
한 젊은이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것을 적어 주머니에 넣어 두고는 다른 사람에게 해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갑갑한 곳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그 이야기들이 ‘邪(사)’가 되어 그 젊은이의 주머니 안에서 두런두런, 그를 죽일 의논을 했다고 한다. 이야기꾼은 성화를 견디다 못해 결국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덧 밤은 깊어가고 피곤하고, 졸음도 몰려왔다. 그는 한 가지 꾀를 내어 ‘어떤 사람이 호박을 지고 산길을 가다가 잘못하여 그것을 굴려 버렸다’고 하며 입을 다물어 버렸다.
듣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며 다음을 재촉하면 이야기꾼은 ‘산이 하도 높아 아직 굴러 내려가고 있다’고 둘러댄다. 그는 더 이상 아무리 졸라도 ‘아직 굴러 내려가고 있다’고만 되풀이한다. 이쯤 되면 듣는 쪽도 단념하고 모두들 털고 일어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고 만다.
諧謔(해학)과 機智(기지)가 담긴 民譚
우리 민족의 諧謔(해학·homour)과 機智(기지·wit)를 엿볼 수 있는 것이 民譚(민담)이다. 그런 이야기 중 어른들을 상대로 한 것은 단순히 諧謔的(해학적)인 것인데, 《於于野談(어우야담)》에 나오는 ‘恐妻家(공처가)’ 이야기가 그것이다.
한 將帥(장수)가 10만 군사를 앞에 두고 東西에 깃발 한 개씩을 세워놓고는,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붉은 旗(기) 앞에, 무섭지 않은 사람은 푸른 旗 앞에 서 있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모두 붉은 旗 앞에 섰는데 한 병졸이 홀로 푸른 旗 앞에 가 서더란다. 알고 보니 그의 부인이 남자는 세 명만 모이면 女色(여색) 이야기를 하니 남자 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고 해 푸른 旗 앞에 섰다고 한다.
民譚(민담) 중에는 敎訓(교훈)을 주는 것도 있다. 한 여인이 부엌에 드나드는 쥐에게 오가며 쌀을 주어 먹게 했더니 나중에 그 쥐가 커져 그녀의 남편과 똑같은 사람으로 변해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는 주부들에게, 곡식 낟알을 함부로 흘리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또 아들을 셋이나 둔 부부가 딸 낳기를 소원했더니 여우가 딸로 태어나 집이 망했다는 이야기는 男尊女卑思想(남존여비사상)이 담겨 있으며, 萬事(만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내포하고 있다.
한바탕 웃음을 선사하는 ‘가자미 눈’ 이야기
民譚(민담) 중에는 고달프고 암담한 현실을 잊기 위한 백일몽 같은 이야기도 있다. ‘우렁이 각시’ 이야기가 그런 예이다. 한 가난한 총각이 밭에서 일하며 ‘이 농사를 지어 누구랑 먹고 살꼬?’ 했더니 어디서 ‘나랑 먹고 살지, 누구랑 먹고 살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둘러보니 밭 구석에 있던 우렁이가 그 말을 했더란다. 총각은 그 우렁이를 잡아다 자기 집 물독 안에 넣어두었는데 그날부터 일을 하고 돌아오면 누군가가, 밥상을 차려 놓았더란다. 하도 이상해 하루는 밭에 나가지 않고 숨어 몰래 보았더니 그 우렁이가 예쁜 처녀로 변해 상을 차리더란다. 그래서 총각은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 잘 살았다는 것이다.
그냥 좌중을 한바탕 깔깔대고 웃게 만드는 民譚도 있다. ‘꼬마신랑’ 이야기가 그것이다. 장성한 처녀가 시집을 왔는데 신랑이 너무 어렸다. 누군가가, 밤(栗)을 먹이면 잘 자란다고 해, 꼬마 신랑에게 밤을 삶아 까먹였는데, 다 먹이고 껍질을 치울 때 신랑을 함께 쓸어내 버려 헛간에서 겨우 찾아왔다고 한다. 가자미 눈 이야기도 재미있다. 그 물고기는 두 눈이 한 쪽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 메기장군이 꿈을 꾸고는 가자미에게 解夢(해몽)을 해달라고 해 가자미가 ‘그것은 죽을 꿈’이라고 해몽해 주었다. 그러자 성이 난 메기 장군이 ‘이 새×, 재수 없는 소리 한다’며 뺨을 때렸는데 너무 세게 때려 눈이 한쪽으로 쏠렸다고 한다. 가자미 눈이 한 쪽으로 몰린 것도 거기서 유래되었다고 전한다.
한 마디로 民譚(민담)은 順厚(순후)한 우리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생생하게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