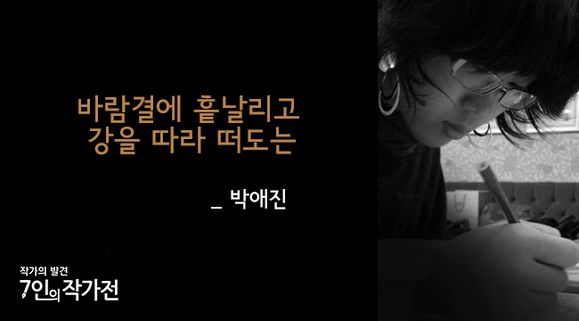[7인의 작가전] 바람결에 흩날리고 강을 따라 떠도는 #1
[중앙일보] 입력 2016.08.11 00:01 수정 2016.08.11 00:01

.으슬으슬 춥고 몸이 떨렸다. 기다시피 움직여 방문을 열고 일꾼을 찾아 불을 더 지펴 달라 청했다. 열 살 남짓한 아이가 들어와 화로에 숯을 넣고 기다렸다. 주섬주섬 몸을 뒤졌다. 주머니를 찾아 돈을 꺼내는 단순한 동작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아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일하는 아이들의 태도는 처음 길을 떠날 무렵과 많이 달라졌다. 여관에서 손님 잔심부름을 하거나 청소 따위를 하는 아이들은 대체로 없는 집에서 굶지나 말라고 보낸 어린 자식들이었다. 여관 주인은 숙식을 제공할 뿐 따로 돈을 주지 않았다.
객들이 마음 씀씀이가 곱거나 똘똘한 아이들에게 순전히 호의로 몇 푼 쥐여 주곤 했다. 나도 그랬다. 아이들은 대체로 순수하게 기뻐하거나 어쩔 줄 몰라 사양했다. 어느 순간부터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이 생기더니 이제는 당연해져 돈을 주지 않으면 시중도 들지 않았다.
“의원 불러 드려요?”
아이가 물었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 멀뚱히 보다가 얼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돈을 받아 나갔다. 그러고 보니 같은 방에 머물던 객들이 어느 틈에 슬금슬금 옆방으로 사라졌다. 혹시 몹쓸 병이라도 옮을까 겁났나 보다. 자리에 눕는데 앓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스물아홉 해를 살아오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다. 있는 대로 옷을 껴입고 이불 속에 몸을 말았다.
아무도 없는 휑한 방에서 화로만 타닥타닥 불을 피웠다. 갑자기 울컥 눈물이 맺혔다. 내 신세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됐단 말인가?
나는 나면서부터 제자리에 있질 못했다. 머리도 못 가눌 갓난아이 때부터 사방으로 눈을 굴리더니 마침내 기기 시작한 후로는 온 집안을 헤집으며 뭐라도 잡고 일어서려다 밥상이며 찬장을 엎었고, 수없이 넘어져 무릎이 성할 날이 없었다.
마침내 제대로 걷고 뛰게 되자 집에 붙어 있지를 않았다. 세 살 이후로 삼일이 멀다하고 바깥에서 잠을 자 부모 속을 무던히 태웠다. 들판을 헤매고, 겁도 없이 혼자 산에 올랐다.
엄마는 그때마다 매를 들며 정 쏘다녀야겠으면, 집에 보탬이 되는 거라도 가져오라 했다. 나도 그러려 해 봤다. 버섯을 캐거나 머루 따위를 따 모으기도 했지만 들고 다니기 성가셨다.
몸이 가벼워야 멀리 갈 수 있었다. 나는 한두 끼 먹을거리, 아빠의 낡은 겉옷 외에는 지니지 않았다. 아빠 겉옷은 가볍고 따뜻해 저녁이면 걸쳐 입고, 밤에는 잠자리로 하기 딱 좋았다. 그렇게 온 사방을 돌아다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빗자루를 들고 쫓아왔다. 나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다. 누나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다.
“이놈 자식! 밤마다 들개가 물어갔나, 호랑이한테 먹혔나, 어디서 구르기라도 했나 마음 졸이며 살아야겠어? 이리 안 와?”
엄마가 제풀에 지쳐 악을 썼다.
“그거 때린다고 나을 병 아니요.”
울타리 너머에서 40줄에 이른 사내가 말했다. 등에는 지게 가득 한 짐을 메고 있었다.
“뉘시오?” 엄마가 물었다. 사내가 자기 집처럼 싸리문을 밀고 들어왔다.
“그 꼬마 나 주쇼.”
“뭐요?”
엄마가 넋을 잃고 되물었다. 누나가 쏜살같이 뛰어나갔다. 사내는 평상에 주저앉아 등짐에서 크고 작은 머리빗, 차곡차곡 쟁인 여러 가지 모양의 항아리, 나무 상자, 주걱, 배내옷, 색색깔 향료를 끝없이 꺼내 늘어놓았다. 나는 먹이에 홀린 짐승처럼 한 발짝, 한 발짝 사내에게 다가갔다. 엄마가 날 잡아 치마 뒤에 숨겼다. 아빠가 낫을 쥔 채 달려왔다. 누나가 숨이 턱에 차 뒤따라 들어와 사내를 가리켰다. 사내는 살기등등한 아빠를 보고도 기죽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태연자약하게 맞이했다.
“이 병은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소이다.”
사내는 절대 한곳에 붙어살지 못하는 병이 있다고 했다. 자기도 달고 사는 병인데 매로도, 의술로도 고칠 수 없고, 억지로 가두면 병들거나 기어이 뛰쳐나가 짐승 밥이 될 팔자나 자기가 데리고 다니며 장사를 가르치면 먹고는 살리라 했다.
“저 코흘리개가 어디 셈이나 제대로 하겠소?”
아빠가 묵직하게 말했다.
“나도 저 병이 어떤지 아는지라 차마 지나치기 못해 들렀으나, 솔직히 저런 비실비실한 꼬마를 데리고 다니며 장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오. 말대로 셈도 못 배우는 놈은 영 못 배워.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 몸도 약해, 짐도 못 들어, 지 손가락도 제대로 못 세 열을 헤아리고도 손가락이 남으니, 정말 하다 하다 그렇게 한심한 놈은 처음 봤소. 그래도 어쩌겠소. 그냥 등에 짐 하나 더 얹었다 치고 데리고 다니다 지 살 길은 열어줬다오. 아, 일단 날 따라나섰으면 내 아들인 것을, 당연한 일이지. 그 뒤 몇 번 이 병을 타고난 애들을 봤지만 다 못 본 척 지나쳤소. 그게 어디 두 번 할 짓인가. 그런 연, 또 맺을까 겁난다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난 이대로 짐승 밥이 되어 장례 치를 시신도 못 찾거나 병들어 죽을 팔잔데, 저 사내는 내가 작고 마른 데다 행여나 멍청할까 싶어 데려가지 않으려 했다. 아빠도 화들짝 놀라 여직 쥐고 있던 낫을 내려놓더니, 날 데려가 부디 사람 구실이나 하며 살게 해 달라 사정했다.
“저래 보여도 아주 미련한 놈은 아니요. 키야 자랄 테고 또래에 비해 아주 작지도 않소.” |